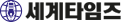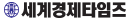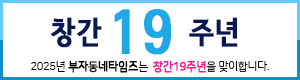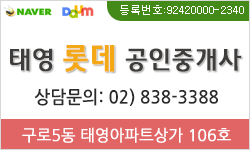지성인의 고뇌 '세월호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충진 교수, 세월호 아픔에 철학적 치유 시도
(서울=연합뉴스) 임형두 기자 = "2014년 4월 16일은 나에게도 특별한 날이다. 그날 이후 나의 일상은 송두리째 무너졌다."
시대의 아픔을 함께하는 지성인의 심사는 처절하다. 크나큰 충격과 슬픔 앞에 너와 나의 구분이 어디 있겠는가. 진정한 지성인에겐 남의 상실이 곧 나의 상실이요 남의 고통이 바로 나의 고통이다.
철학자 이충진(한성대 교양교육원 교수) 씨. 그는 세월호 참사 후 하루하루 숨쉬기조차 힘들었다고 고백한다. 도망갈 곳은 처음부터 없었다. 슬픔도, 고통도 허락되지 않았다. 희생자 가족에게 사죄의 마음을 가질 수조차 없었다.
그렇게 몇 달을 썩은 나무처럼 보내야 했다는 이 교수. 밝을 때면 어둠을 찾았고 어두워지면 산길을 걸었던 나날들. 그 트라우마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해 세월호와 정면으로 맞서기로 했다.
그 결과물인 저서 '세월호는 우리에게 무엇인가'(이학사). 이 교수는 세월호의 참담함과 치유책을 직설적으로 담아냈다. 카오스를 털고 코스모스로 돌아오려는 몸부림. 외면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님을 1980년 광주항쟁이 분명히 가르쳐주었기에 세월호의 면면을 기록하기 시작했다고 토로한다.
이 책은 분량이 적은 편이다. 모두 해봐야 150여 쪽. 하지만 한 마디 한 마디에 통절의 외침이 오롯이 담겨 있다. 시대 현상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우리는 도대체 누구이며 어디를 가고 있느냐고 뼈아프게 묻는다. 그 철학적 질문과 대답은 설득력과 감명을 더한다.
그는 첫 마디부터 도대체 '국가란 무엇이냐'고 외친다. 304명의 목숨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해경을 보면서, 사람 목숨을 담보로 돈을 버는 업체를 방치하는 정부를 보면서, 죽음의 원인을 밝혀달라는 유가족을 외면하는 청와대와 국회를 보면서 이 질문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다.
그러면서 자문자답하듯 말한다. 근대국가는 국민의 보호기관이라는 '홉스의 국가'도, 국민의 자연권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라는 '루소의 국가'도 4월 16일 대한민국에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탄한다.
그렇다면 부모가 아이를 보살피듯 국민을 보살펴야 한다는 '공자의 국가'는 과연 존재했는가. 역시 아니라며 이씨는 고개를 가로젓는다. 국가와 국민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를 따지는 첫 발걸음을 떼기도 전에 국가는 국민을 '남의 자식'으로 대우해버렸다는 것. 이는 희생자 유가족을 보며 "인간적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 없었다"고 역설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모습과 뚜렷한 대조를 이뤘다고 안타까워한다.
세월호 침몰에서 확인된 대한민국의 실체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질타한다. 세월호 침몰 이전의 국가권력 또한 철저히 선택적으로 작동해 국가권력이 모든 국민의 이익을 위한 공적 권력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대신 소수에 의한, 소수를 위한, 소수만의 국가였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소수란 대기업, 전·현직 관료, 정치인을 가리킨다.
세월호 침몰 이후 수없이 직면해야 했다는 야만성의 한국사회에 정녕 희망은 없는가.
저자는 이름 없는 다수에게서 희망을 본다. 인간 존엄성을 중시하는 사회, 자유·평등·연대라는 근대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 인간 친화적인 공동체, 그곳을 향한 그들의 노력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에 일말의 희망을 건다. 특히 기록 만들기와 수집하기 등 세월호를 기억하기 위한 노력이 한국사회를 한 단계 더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것.
이 교수는 '외면'이 아닌 '대면'으로, '망각'이 아닌 '기억'으로 '세월호의 이후'를 만들자고 간곡히 호소한다. '지금 여기'의 철학에 대해 질문하는 게 과제 해결의 출발점이며 세월호 이후를 우리의 건강한 미래로 만들 때 비로소 세월호 슬픔을 진정성 있는 슬픔으로 보존할 수 있다고 설파한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