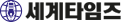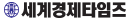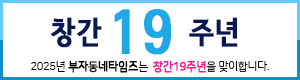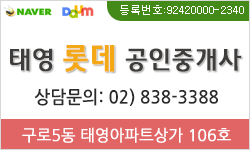|
| △ |
[부자동네타임즈 박윤수기자] "추억이 담긴 자료들이라 기증을 결정하고도 솔직히 많이 아쉬웠어요. 그래도 한국영화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 거 같아 뿌듯합니다."
1970년대 순회영사업을 한 한규호(67) 연합영화공사 대표는 그간 유실돼 실체를 확인할 수 없던 고전 한국영화 94편을 포함해 총 450편의 필름을 최근 한국영상자료원(KOFA)에 기증한 소회를 12일 이렇게 밝혔다.
이번에 다시 세상으로 나온 한국영화 94편 중에는 1940∼1980년대 이만희, 임권택, 정진우, 김수용 등 당대 최고의 감독 작품을 비롯해 노필, 홍은원, 정진우, 최하원 등 거장 감독의 데뷔작도 있다.
한 대표의 이번 기증이 그간 취약했던 고전 한국영화 보유율을 높이고, 한국 영화사의 사료적 공백을 상당히 메운 셈이다. 영화는 '시대를 기록하는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
한 대표는 선친 한우섭 씨를 이어 일찍이 순회영사업에 뛰어들었다.
순회영사는 과거 상설 극장이 없는 군 단위 이하의 시골 지역에서 이뤄진 영화 상영 관행으로 순회에 필요한 기자재인 영사기, 발전기, 확성기, 이동차량 등을 갖고 여러 지역을 다니며 영화를 상영하는 일종의 '찾아가는 극장'이다. 과거 농어촌 산간 지역민들이 영화 구경을 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했다.
"평지에 말뚝을 세우고 천으로 벽을 두르면 극장이었죠. 의자도 없어 가마니를 깔고 영화를 봤어요… (웃음) 당시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은 관람료를 내지 못해 농산물이나 오징어를 돈 대신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건을 시장에 되팔아 돈을 받고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날이면 영화를 일주일 동안 상영하기도 했어요."
당시 순회영사업을 하는 14개사 가운데 한미영배사(연합영화공사 전신)는 전국을 순회할 수 있는 등록증을 보유한 최대 규모의 회사였다.
한 대표는 "그때 영화 판권료는 보통 10만원 미만으로 그리 높은 편이 아니었다"며 "영화를 제작하는 데 진행비도 없는 경우가 많아 우리가 차용증을 써주고 영화가 완성되면 작품을 재구매하는 방식이 흔했다"고 전했다.
순회영화사가 영화 제작사로부터 필름을 가져오면 반납하라는 제작사도 거의 없었다고 한다. 영화 필름에 대한 보존 인식도 미약했다.
"개인적으로 기억나는 일은 영화 제작자의 집에 판권협의를 하러 갔는데 집 뒤편에 필름을 쌓아두고 보관하더라고요. 나중에 가봤더니 장마로 필름 대부분이 녹슬고 유실됐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전 한국영화가 많이 사라진 이유를 한 대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당시 영사기가 워낙 낡아 영화를 여러 번 상영하고 나면 필름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어떤 필름은 10∼20분이 잘려나간 일도 있고요. 그러니 오래 관리하기도 어렵죠."
1970년대 들어 방송이 활성화하고, 지방 극장도 많아지면서 순회영사업은 하향길로 접어들었다. 그럼에도 순회영사업이 2000년대까지도 명맥을 유지한 이유는 다름 아닌 '예비군 창설'과 '국방부' 덕분이었다.
"1968년 예비군이 창설되면서 훈련이 끝나면 훈련병들에게 영화를 상영해줬어요. 반공영화가 대부분이었죠. (웃음) 더 재밌는 건 상영료를 예비군이 아닌 약장수들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약장수가 우리에게 상영료를 주면 이들이 영화 상영에 앞서 약을 홍보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휴양소에서 필름을 종종 임대해가기도 했어요."
한 대표는 한평생 수집한 영화 필름으로 제주도에 영화박물관을 차리는 꿈이 있었지만, 고령과 날로 악화하는 건강 상태 탓에 현재는 그 꿈을 접었다.
"과거 순회영사를 하고 가져온 필름은 아내가 직접 정성껏 손질하고서 창고에 잘 보존했습니다. 한때 2천여 편에 이르는 영화를 보유했던 적도 있었지만, 장마와 화재로 3분에 1 이상이 소실됐어요. 더 많은 자료를 기증할 수 있었는데…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