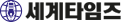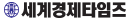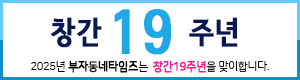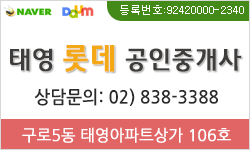전문가들 "메르스 계기로 역학 전담요원 육성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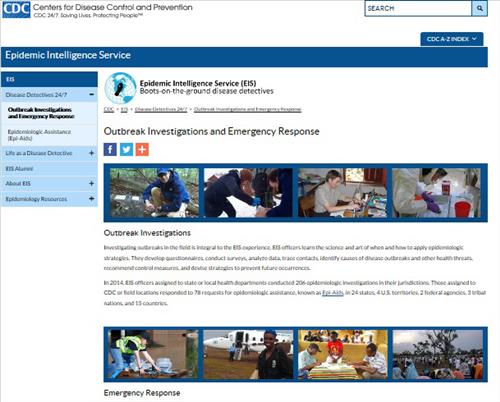 |
| △ 미국 CDC 홈페이지에 역학조사관의 업무가 자세히 소개돼 있다. |
방역대책 최선봉 '질병 수사관'…미국 4천명 vs 한국 20명
감염병 사태마다 감염내과 교수 차출해 '땜빵식' 대응
전문가들 "메르스 계기로 역학 전담요원 육성해야"
(서울=연합뉴스) 김길원 기자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같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초기 대응은 최초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다.
역학조사는 특정 감염병의 발생 원인과 특성을 밝히는 것으로, 해당 질환이 확산하지 않도록 방역 대책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
국내에서 확산 일로를 걷고 있는 메르스도 마찬가지로 첫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무엇보다 중요했다. 첫 환자의 치료 및 격리와 접촉자에 대한 감염 관리의 중요성 때문이다.
그러나 이 환자가 병원을 거쳐 방역당국에서 메르스 확진을 받기까지 제대로 된 역학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미흡한 역학조사 탓에 방역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면서 해당 환자는 다른 사람한테 병을 옮길 수 있는 바이러스량이 최대치까지 올라가는 중증 시기를 거쳤고, 2차감염자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다.
이번 메르스 확산을 계기로 국내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방역시스템을 통째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파동으로 질병관리본부가 발족했지만 현재 역학조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은 채 20명도 되지 않는다.
이중에서도 감염병 역학 전문가는 한 손에 꼽을 정도다. 때문에 감염병 사건만 터지면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감염내과 전문의를 차출해야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민간에서 감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면에서 미국의 방역 체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 질병관리본부(CDC)는 1만5천명의 직원에 연간 11조원 정도의 예산을 사용한다. 미국의 전 세계적 지위가 그렇듯이 CDC도 세계 보건의료 분야의 경찰과 소방관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이런 미국 CDC는 매년 약 70명의 최정예 '역학조사 전문요원(EIS)'을 양성한다.
EIS는 의대 졸업생이나 역학분야 박사자격자를 선발해 2년간 체계적인 실무 교육을 통해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1994~1996년 CDC 역학조사 전문위원을 역임한 강대희 서울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서울대의대 학장)는 "역학 조사의 특성상 질병의 원인을 수사하듯이 찾아내야 하고 필요시에는 격리조치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역학조사 전문요원은 '질병 수사관(disease detective)'이라고도 불린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지난 60년간 배출된 질병 수사관만 약 4천명에 이른다. 인구를 고려한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20명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인력규모다.
강 교수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역학조사 전담 요원을 육성하고 국가 단위에서 질병 감시체계를 총괄하는 '국립역학원'의 설립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번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우리 질병관리본부에도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면서 "또 보건 의료정책의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수립하면서 국민의 건강과 의료를 전담하는 제2차관 제도의 신설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http://blog.yonhapnews.co.kr/scoopkim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