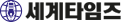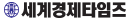|
| △ (연합뉴스 자료사진) |
<주말 문화재 탐방> 서대문형무소, 가슴 먹먹해지는 현장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독립문 옆, 안산 기슭에 자리한 서대문형무소(사적 제324호)는 유관순과 강우규가 생을 마감하고 김구, 여운형, 안창호, 윤봉길 등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투옥됐던 곳이다.
일제는 1908년 10월 이곳에 500여명을 수용하는 목조 건물인 '경성감옥'을 세웠다. 그러다 1912년 마포구 공덕동에 새로운 감옥을 신축하면서 '서대문감옥'으로 명칭을 바꾸었고, 1923년 서대문형무소로 개칭했다.
붉은색 벽돌로 쌓은 길이 1천161m의 담에는 수용자를 감시하기 위한 망루 6개를 설치했고, 그 안에 좁은 방이 빽빽하게 들어찬 옥사를 배치했다.
서대문형무소는 한여름이면 태양을 피할 만한 장소가 없고 수감 인원이 많아 무더웠다. 3·1운동을 하다 잡혀 형무소에 들어온 심훈은 당시 상황을 '옥중에서 어머니께 올리는 글월'이라는 편지에 남겼다.
"날이 몹시도 더워서 풀 한 포기 없는 감옥 마당에 뙤약볕이 내리쪼이고 주황빛의 벽돌담은 화로 속처럼 달고 방 속에는 똥통이 끓습니다. (중략) 생지옥 속에 있으면서 하나도 괴로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의 눈초리에나 뉘우침과 슬픈 빛이 보이지 않고, 도리어 그 눈들은 샛별과 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3·1운동을 기해 급격하게 증가한 형무소 수감자는 일제가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치른 1930년대 다시 늘어났고, 해방을 앞둔 1943년에는 연간 재소자가 2만3천532명에 달했다.
광복 이후 서대문형무소는 '서울형무소'로 다시 이름이 변경됐으며, 1987년까지 민주화운동가를 포함해 수많은 사람이 복역한 교도소와 구치소로 쓰였다.
오늘날 서대문형무소는 대한민국의 독립과 민주를 향한 투쟁의 역사가 깃든 전시와 체험 공간으로 활용된다.
1923년 완공된 보안과 청사는 독립운동의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물로 꾸며져 있다. 지하에서는 독립운동가가 녹음한 육성 증언을 들을 수 있고, 2층 한편에는 독립운동가의 수형 기록표로 벽을 채운 추모 공간이 마련돼 있다.
보안과 청사를 빠져나오면 수감자를 감시하고 통제하던 중앙사와 옥사가 나타난다. 중앙사에서는 옥살이를 했던 사람들의 생활상을 설명한 자료와 그들이 남긴 기록을 볼 수 있다.
길쭉한 벽돌 건물인 옥사는 1922년 지어졌으며, 4동이 남아 있다. 그중 12옥사에는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는 2.4㎡ 넓이의 '먹방'이 복원돼 있다.
이외에도 형무소에는 재소자들이 노역을 하던 공작사와 사형장 건물, 시체를 빼내기 위해 조성한 시구문, 2010년을 전후해 재건된 여성 수감자 옥사와 취사장 등이 있다.
한편 서대문형무소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여성 독립운동가 266명의 이름과 사진을 인쇄한 대형 현수막을 9옥사 앞에 전시하는 특별전 '돌아온 이름들'을 오는 23일까지 진행한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