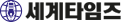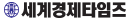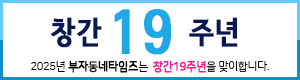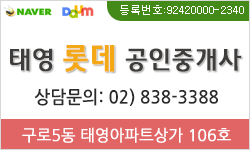|
| △ 분단 70년 북위 38도선의 '평화이발관' (포천=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 '평화이발관' 이발사 이응수(61)씨가 스마트폰으로 북위 38도선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15.8.12 <<지방기사 참조>> andphotodo@yna.co.kr |
"통일되면 달려가려고"…38선에 자리잡은 '평화이발관'
"통일 간절함 다르지만 증언 녹화 작업은 끝냈으면…"
(포천=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스마트폰의 GPS앱을 켜자 위도가 38.007075다.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 '평화이발관'은 거짓말처럼 북위 38도 선상에 위치했다.
"여기 마당에 예전에 38선이 지나갔다니까요"라는 이발사 이응수(61)씨의 얘기가 과장이 아니었음이 입증된 순간이다.
이씨는 "아버지가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이라, 언제라도 통일이 되면 빨리 가려고 이곳에 자리를 잡은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열네살 때부터 이발 기술을 익힌 이씨는 1980년대에 이 땅을 샀다.
사람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마을 어귀나 시가지가 아니라 이발관 부지로는 다소 부적절했지만 그저 38선 자리였다는 사실 하나에 혹했다고 한다.
여기에 집을 먼저 짓고 살면서 양문리 시내에서 이발관을 운영하다가 2009년 이곳으로 옮겨왔다. 이름부터 남다른 평화이발관은 그렇게 40여년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씨가 38선, 곧 '분단'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이게 된 데에는 아버지의 영향이 컸다.
북한지역인 강원도 회양군 출신의 아버지 고(故) 이승달씨는 해방 후 가족 품을 떠나 월남했다. 한국전쟁 전이라 남북 왕래가 불가능하진 않던 때였다.
언제라도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던 고향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60년 넘게 귀로가 막혔다.
아버지는 이제나저제나 "통일이 되면"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38선 언저리를 떠나지 못했다.
그런데 이씨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북한의 공산주의 정치를 혐오했다. 월남한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항상 얘기했다.
이씨는 "북에서 큰 어머니가 여성연맹위원장이라는 직책을 지고 있었다던데 그 얘기만 나오면 너무나도 싫어했다"며 "돌아가시기 전에 이북에 계신 가족과 친지 명부를 작성하셨는데 큰어머니만 거기에서 빠져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아버지께서 '거긴(북한은) 부모도 형제자매도 없다'는 비난을 평생 하셨다"고도 했다.
당시 수복지구 주민 정서가 그랬다고 한다. '되찾은 곳'이란 뜻의 수복지구(收復地區)는 분단으로 북한의 통치를 받다가 전시에는 유엔군 아래 있었고 전후에는 휴전선을 따라 남한으로 편입된 38선 이북 중동부 접경지역을 일컫는다.
한때 '북한 인민'이었다가 월남한 이씨 아버지 같은 사람들은 대개 투철한 반공의식을 쌓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 바뀌어갔다.
이씨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이게 들었다.
그러나 소년에서 청년으로 성장하면서 이씨의 '분단 감수성'은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색깔로 칠해졌다.
아버지처럼 북한 정치에 진저리가 나지도 않았고, 동네 어르신들로부터 주워들은 얘기 속 민족 간 비극성만 마음 아프게 다가왔다.
전쟁이 발발했을 때 면장 가족이 마을 주민들에 의해 살해됐다가 1·4 후퇴 때는 그 주민이 거꾸로 다른 마을 주민들에 의해 살해당한 역사는 입으로만 전해져오는데도 실감이 났다.
당시 38선 이남의 공산주의자들을 '지방 빨갱이'라고 불렀는데, 이들과 다른 주민들 간 반목이 심했다고 한다. 말 그대로 '우리끼리' 죽고 죽이던 셈이다.
젊은 시절엔 평양에 지하철이 뚫린다는 내용의 잡지 기사에 놀라 아버지에게 보여줬다가 거센 호통을 듣기도 했다.
경기북부지역 미군부대마다 공사현장 책임자로 일하던 아버지 밑에서 자랐지만 2003년 포천 영평사격장(로드리게스)에서 열린 반미시위 도중 대학생이 탱크에 올라갔다가 다치자 병원으로 데려가기도 했던 그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이 개최한 시위였는데, 보수적인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혀를 내두를 일이다.
통일을 향한 간절함도 아버지와는 다르다.
이씨는 "20년 전까지 아버지는 통일이 이뤄지기만을 기다리다가 돌아가셨지만, 너무 오래 이렇게 지내온 탓인지 나는 통일이 될 거라는 생각도 잘 안 든다"며 웃었다.
외려 그는 민족의 비극적 역사를 목격한 어르신들의 기억을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다는 꿈을 얘기했다.
2006년부터 추진했다가 갑자기 희귀병에 걸려 중단했던 '증언 녹화 작업'을 더 늦기 전에 재개하고 싶단다.
예전부터 이발관은 옛 아낙네들의 빨래터마냥 지역의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 장소였고, 이에 착안해 그는 분단과 전쟁의 역사를 직접 겪은 동네 노인들의 증언을 영상에 담는 작업을 시도했다.
그러던 중 '길링발리'라는 신경다발염을 앓게 되면서 재활을 하느라고 모든 손을 놓게 됐다. 다행히 지금은 완치했다.
머지않아 들을 수 없게 될 작은 목소리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 이응수 씨가 묵은 역사의 수염을 면도하는 방식이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