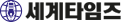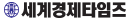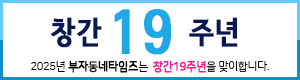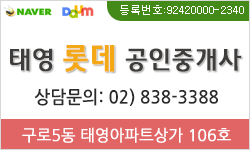|
| △ 대안문을 나서는 고종의 어가행렬 |
(서울=포커스뉴스) 한국 근대사의 중요한 사료가 될 만한 대한제국시절 고종황제의 초기 행차장면과 명성황후 장례식이 담긴 희귀사진을 포커스뉴스가 단독 입수했다.
구한말 한국에서 활약한 아서 웰본 선교사의 손녀딸인 웰본 에비여사가 국립민속박물관에 기증할 이 사진은 새디(Sadie)란 사람이 찍은 경운궁(덕수궁) 大安門 (대한문의 전 이름)을 나서는 고종황제의 행차모습과 도티(Doty)란 사람이 담은 명성황후 장례행렬이 운종가(종로)를 지나는 모습이다. 이 사진들은 1904년 새디가 웰본 선교사에게 직접 선물한 사진이다.
명성황후 민비는 1895년 10월 8일 일본 자객에 의해 경복궁 건청궁에서 시해 당했다. 민황후의 장례식은 2년이 지난 1897년 11월 21일, 22일에 치러졌다.
이 장례식에 직접 참여한 주한미국공사 호레이스 알렌에 의하면, 당시 대한제국에 주재한 많은 외교사절이 장례식에 초대되었다.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국정에 자신이 생긴 고종은 미뤘던 황후의 장례식에 외국인들도 많이 초대했다. 명성황후의 장례식사진을 찍은 도티도 외국인 자격으로 장례현장을 목격하고 사진을 담은 것으로 추정된다.
새디가 기록한 대안문의 고종어가사진은 정확한 연대를 알 수가 없지만 대안문이 경운궁의 정문격으로 사용한 초기로 추정된다. 고종의 어가행렬이라며 장소는 영어로, East Gate로 표기돼 있다.
대안문은 원래 경운궁의 동문이고 남쪽에 위치한 인화문이 정문이었다. 고종이 아관파천 이후 러시아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환궁(1897년 2월 25일)해 대한제국을 선포(1897년 10월 12일)한 이후, 환구단(圜丘壇)으로 제를 지내기 위해 대안문을 나서는 모습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에 황제가 기거하는 경운궁에서 광화문 육조거리의 관아와 환구단과의 연결성 문제로 기존의 정문인 인화문이 대신 대안문이 정문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대안문의 편액은 1899년 3월 당시 의정부참찬 민병석(閔丙奭)의 글씨(국립고궁박물관 소장)로 새로 걸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사진상의 글씨와 비슷하지만, 새디사진의 편액부분만 키워보면 안(安)자의 받침 녀(女)의 부분에서 차이가 드러나며 대(大)도 약간 다르다.
따라서 새디 사진의 대안문 편액은 1899년 3월 이전의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1905년 청나라에서 발간된 청한전시풍경사진첩(淸韓戰時風景寫眞帖)에 게재된 고종의 행차 장면에 나타난 대안문은 민병석글씨지만, 1897년 고종의 환궁사진에는 대안문 편액이 새디 사진과 일치한다.
같은날 찍은 것으로 보이는 새디의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총을 든 신식군인이 대안문 앞에서 경계하고 있고, 그 안쪽으로 고종의 어가행렬이 지나가는 모습이 보인다. 대안문의 오른쪽 서양식 건물은 언제 건축했는지 확실치 않지만, 1899년 6월 고종이 새로 설치한 정부 직제인 원수부(元帥府)가 사용한 기록이 있다.
1986년 4월 30일자 경향신문에 미 여행가 버트 홈즈가 한국을 기행하면서 촬영한 사진이라며 단독 보도한 고종어가’ 사진과 비교해 보면, 홈즈의 사진은 대안문 오른쪽 외래건물이 깨끗하게 단장돼 있다. 경향신문은 고종이 민황후 묘소에 가기위해 대안문을 나서는 길이라고 게재했다. 모자를 쓰고 각반을 찬 신식군인도 더 밀집돼 있다, 새디의 사진에는 그 건물 밑에 허름한 판자집이 있고 적은 숫자의 신식군인과 갓을 쓴 구식군인, 일반 주민이 끼어 있다.
따라서 새디의 사진이 홈즈의 사진보다 더 오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홈즈의 사진에는 대한제국의 원수부가 입주해 새롭게 단장한 것으로 보인다. 경운궁 대안문은 1906년 대한문(大漢門)으로 이름을 바꾸기 전까지 수차례 수리한 기록이 있다.
도티가 담은 명성황후의 장례행렬은 상여의 후미부분이 보이며, 운구행렬이 운종가를 지나고 있는 모습이다. 뒤에 보이는 산은 북악산의 오른쪽 끝부분이다. 윤달이 끼었던 1897년, 11월 중순, 나뭇잎들이 제법 풍성하다. 그동안 명성황후의 장례식 사진은 몇 장이 발굴되었지만, 촬영자의 이름은 물론, 당시의 의상과 구체적인 장소와 주변 환경이 비교적 선명하게 나타난 것은 이 사진이 처음이다.
도티의 또 다른 사진은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에 시해된 장소로 추정되는 경복궁 건청궁 곤녕합 사진이다. 아마도 명성황후가 시해된 이후에 담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인데, 사진을 담고 있는 미국여성을 다소 경계하는 사람들이 보인다. 사진에 나타난 당호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이 건물이 사라져 정확한 장소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도티의 사진을 새디가 웰본선교사에게 보낸 메모엔 분명하게 조선 왕비가 시해된 집이라고 돼 있다. 이 부분은 고증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다.
고사진을 역사적 관점에서 고찰한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염복규교수는 명성황후 시해된 장소라는 사진은 더 검증할 필요가 있지만, 나머지 3장의 사진은 한국 근대사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사료가 될 것 같다. 특히 대안문을 나서는 고종어가 사진은 대안문을 정문격으로 사용한 시기의 초기의 사진으로 보이며, 신식군대와 구식군대가 동시에 보이는 점이 이채롭다고 평가하며해외에 산재한 이러한 희귀자료가 더 많이 발굴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역사적인 사진을 포커스뉴스에 제보한 프리실라 에비(79)여사는 할아버지 아서 웰번에게 물려받은 아버지 헨리 웰번의 유품을 보관해 왔으며, 지난해 국립민속박물관에 한국 근대사에 귀중한 300 여점의 사료를 기증한 분이다. 에비여사는 이 공로로 한국의 문화관광체육부장관상을 받았다.(서울=포커스뉴스)고종의 어가행렬이경운궁 대안문(지금의 대한문)을 나서고 있다.정확한 촬영날자는 알 수 없으나 , 대안문이 경운궁의 정문처럼 사용된 초기의 사진으로 추정된다. 이 사진은 미국인 새디가 담은 것으로 1904년 아서 웰번선교사에게 선물로 준 것이다. <사진제공=프리실라 에비>2016.08.01 김연수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1897년 11월 21일 명성황후의 장례행렬이 운종가(종로)를 지나고 있고 멀리 북악산의 오른쪽 자락이 보인다. 상복을 입은 남녀 주민들이 비운의 죽음을 당한 황후의 넋을 기리고 있다. 이 사진은 도티가 찍은 사진으로 새디가 1904년 웰본선교사에게 자신의 사진과 함께 선물한 것이다. <사진제공=프리실라 에비>2016.08.01 김연수 기자 (서울=포커스뉴스)새디가 찍은 고종의 어가행렬의두번째 사진.총을 든 신식군인들이 도로가를 경계하고 있고, 가운데로 어가행렬의 일부분이 보인다. 대안문 오른쪽 양식건물에 판자칩 같은 작은 집이 붙어 있다. 이 건물은 고종이새로 만든 직제인 원수부가 사용했다. <사진제공=프리실라 에비>2016.08.01 김연수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아관파천이후 1887년 경운궁으로 환궁하는 고종어가 행렬 자료사진. 대안문의 편액이 새디의사진과 일치한다. 2016.08.01 포커스포토 (서울=포커스뉴스)미국인 새디가 담은 구한말 경운궁대안문사진중 편액을 확대한 부분. 1904년 아서 웰번선교사에게 선물로 준 사진이다. <사진제공=프리실라 에비>2016.08.01 김연수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1899년 3월 의정부참찬 민병석이 쓴 대안문 편액. 고궁박물관 소장품. 유물번호 6742016.08.01 김연수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1905년에 발간된 청한전시풍경사진첩에 등장한 대안문. 대안문으로 고종황제가 행차하는 사진인데, 일부 덧칠한 흔적은있지만, 대안문 편액이 민병석글씨인 것과대안문 너머로 공사중인 중화전 모습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1889년과 1902년 사이에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대안문 오른쪽 건물은 대한제국 원수부 건물이고, 신식군인들의 일사분란한 모습이 새디의 사진과는 대비 된다.2016.08.01 포커스포토 (서울=포커스뉴스) 1986년 4월 30일자 경향신문에 거재된 미 여행가 홈즈가 한국기행중 촬영한 고종의 어가행렬사진.이 기사에 의하면 명성황후 묘소에 가기위해 대안문을 나서는 고종의 어가행렬이라고 나와있다. 1897년 장례식 이후, 대안문이 대한문으로 바뀌기 전인1906년 사이에 찍은 것으로 추정된다.2016.08.01 포커스포토 (서울=포커스뉴스) 도티가 촬영한 명성황후가 기거하던 경복궁 건청궁. 촬영 년도가 없고, 건물의 편액도 보이지 않아 좀 더 검증이 필요한 사진이다.<사진제공=프리실라 에비>2016.08.01 김연수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2015년 9월 16일서울 종로구 국립민속박물관을 찾은 웰본 선교사의 손녀딸인 프리실라 웰본 에비 여사가 가져온 유물들을 공개하고 있다. 에비여사는 이 공로로 문화체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2016.08.01 포커스포토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